참 여
이달의 칼럼
작은것부터 기록하고 아끼는 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7월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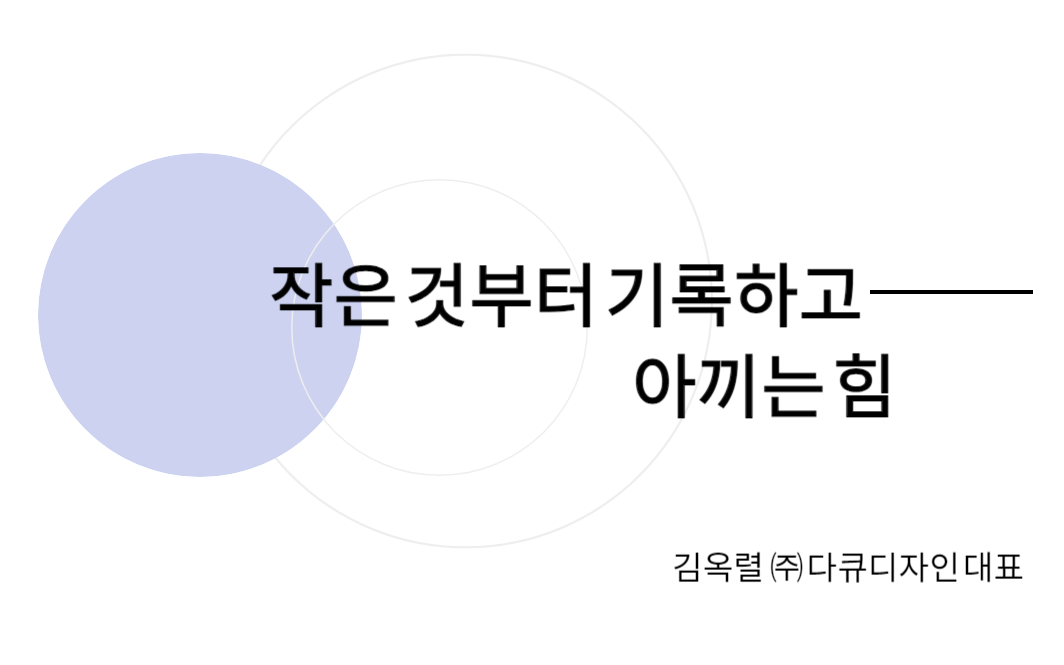
작은것부터 기록하고 아끼는 힘
김옥열(재단 편집위원장, 다큐디자인 대표)
1970년 12월 동방극장은 무등극장으로 이름을 바꾼다. 따라서 1970~80, 90년대까지 광주에서 학교를 다닌 청춘들은 무등극장이 추억이 서린 명소다. 1970년대 수피아여고를 다녔던 임정희 작가는 최근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열린 전시회에 학창시절 ‘무등극장’ ‘제일극장’ ‘광주극장’ ‘시민관’을 오가며 영화를 보고 ‘왕자관’ ‘산수옥’ ‘궁전제과’에서 맛난 음식을 먹었던 추억을 담은 그림 한 점을 내 걸었다. 이 그림은 그 시대를 함께 관통한 이들에겐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하지만 그림속에 나오는 무등극장, 제일극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후 세대들에겐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다.
전시회를 보고 어느 날 무등극장 앞을 지나다 극장 앞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극장이었던 건물은 지금도 남아 있으나 이름표를 바꿔 달았고, 건물 앞 어디에도 과거 이곳이 무등극장이었음을 알리는 안내판 같은 것은 없었다.
유서깊은 무등극장 터
알려져 있다시피 무등극장은 2012년 간판을 내렸다. 무등극장 이전엔 동방극장, 그 이전엔 공화극장, 일제강점기엔 제국관(1930부터), 그에 앞서 1927년 광주최초 상설영화관 광남관으로 출발했다. 영화관 터로만도 엄청난 공간인데, 이곳은 다른 만만찮은 역사를 지닌 터이기도 하다.
여러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곳 무등극장 터는 1483년 경 광주목사를 지낸 설순조라는 분이 처음 지은 객사(客舍) 터라고 한다. 부르기 쉽게 광주객사라 하는데 정식 명칭은 ‘광산관’. 광산관은 수차례 수리를 거듭하면서도 조선시대 내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해 나갔던 것 같고 가까이는 목사 신석유와 남호원이 1872년과 1879년에 각각 수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단다.
객사는 크게 두가지 기능을 했다. 왕을 상징하는 궐패를 모셔놓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모셨고, 관아를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들이 머물던 곳으로서 관아에 관련된 시설들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시설에 해당된다. 전통적인 고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다.
광산관은 1909년 공식적으로 객사의 기능을 상실했고 한일합방 후에 일제는 이곳을 광주군청과 회의실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광주면사무소도 초창기 이 건물 한 켠을 썼고, 광주일고의 전신 광주고보도 1920년 설립 후 누문동으로 이사가기 전까지 2년여 간 사용했단다.
참으로 많은 역사가 깃든 터가 바로 오늘날 남아있는 옛 무등극장 건물 일대다. 하지만 건물 터 어디에도 이런 기나긴 역사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본인 기록도 남기지 못하는 광주
서론이 길었던 것은 우리 광주라는 도시의 문화적 안목과 수준이 겨우 그 정도인 것이 아쉬워서다. 광주 관아는 정확히 어디였는지, 구 시청, 구구 시청은 어디였는지 현장에 가도 알 수 없는 도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일극장은 어떻게 복합관으로 변했고, 신동아극장은 어디였으며, 아카데미극장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걸 잘하는 도시로 여기저기서 전주시 이야기를 하곤 한다. 전주는 3~40년 된 작은 가게 터 하나라도, 그곳이 이야기를 갖고 있던 장소라면 그 가게 사연과 터 무늬를 청동으로 된 알림판에 새겨두었다. 참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근 한 일간지에 ‘광주 어제와 오늘 한눈에 보여줄 도시홍보관을 세우자’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다.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이 주장한다는 내용이다. 취지는 100% 찬성한다. 도시의 변모상을 담고 공간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가 좋다. 그러나 한켠으로 우려스럽기도 하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목소리 높여 건물하나 덜렁 짓고 몇가지 자료 모아놓은 뒤 그걸로 끝인 사업이라면 재고해야한다. 더욱이 자신들이 가진 역사 문화적 자산조차 제대로 쉽게 알리는 일을 못하는, 유실되거나 심지어는 마구 깨트려부수면서도 그 자리에 표지판 하나도 세울 줄 모르는 수준의 도시라면 뭐 안봐도 뻔한 것 아닌가? 나랏돈이 많으니 건물 올리는 것은 쉽지만 천박한 역사문화의식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어서 하는 말이다.












